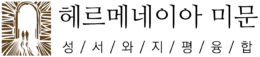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챘다.
움직이지 않는 태양의 정체를 알아버린 사람들이 그 태양의 크기도 재고 거리도 재기 시작했다. 이 거리감의 기술은 태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구 밖 가까운 곳까지 날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오기까지 할 정도의 치밀한 기술로 발전했다. 이러한 측량술에 배인 <의심의 기술>은 사회·문화·정치·경제 인간의 모든 생태 반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태양은 그렇게 이미 존재하는 것인데도, 그 의심의 기술은 또 다른 의심의 기술의 고안을 불러왔다. 그 측량술을 파괴하려는 반동들이 거듭 생겨난 것이다. 그들 중 하나는 이 태양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식한다.
우리가 [태양]이라는 한글을 읽을 때 그것은 ‘태양’이다. 그러나 그것이 ‘태양’이 되기까지는 두 단계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흰 바탕에 검은 선으로 된 두 개 덩어리를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는 ‘태’와 ‘양’이라는 음을 그 두덩어리에 붙여 의미의 결합을 이루는 <작용>의 과정이다.
그러면 [태양]은 언제 존재하는가? (1) [태양]이라고 기록되었을 때인가 (2) 두 개의 문자 덩어리를 목격했을 때인가 아니면 (3)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작용>을 일으키는 순간인가.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아무리 [태양]을 들이대 봐야 이해하지 못한다.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제아무리 [예수]라는 글자를 몸에 좋다고 내복에 꿰매고 다녀도 그 어떠한 존재로도 발생하지 않는 이치다.
노에시스라고 부르는 이 (3)항의 작용을 후설과 같은 사람들이 발전시켰는데 그들에게는 모든 사물이 노에시스 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다. 노에시스는 누스(정신)에 노에인(지각하다)이라는 단어를 붙여 만든 합성어다.
[태양]이라는 글자와 [예수]라는 글자를 내복에 부적처럼 꿰매고 다니는 것도 무속적이지만, 본회퍼와 같은 행동파 항렬의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노에시스와 같은 탐구는 모두 관념적 귀신의 말장난 같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인간의 대화는 “자기”와 “타자” 라는 의식 사이에 발생한다. 특히 “자기”는 “타자”의 여러 가지 행동과 반응을 – 눈 모양, 입 모양, 얼굴 표정 등을 – 살펴가면서 언어구사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이 탐색의 과정 속에서 “자기” 머리 위에 둥둥 떠 있을 “자기의 의식”을 그 타자의 머리 위에 한 움큼씩 뿌려가며 언어구사를 하는 측정술에 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의 노에시스 체계를 이용하여 때로는 과장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낮추는 척도 하고, 때로는 상대를 깎아 내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회적 위협도 가해가면서 자신의 의식을 주입하여 마침내는 자신의 세계를 관철시키고 건설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인간만이 구사하는 언어세계 기술이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지어 놓은 세상을 자신들의 노에시스 언어 체계로 재창설 해 놓았다.
이것이 아담이 훔쳐낸 로고스 체계다.
[성서에서는 이러한 전개가 그의 이름 짓는 기술로 집약되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