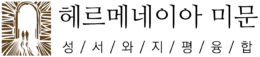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랑을 본능에 의존해서 유지하는 사람과 사랑을 자기 안에 담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속성상 사랑의 본질은 후자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받은 사랑이 없더라도 자신의 본성을 사용하여 타자에게 줄 수는 있다. 이것이 한 가문이 멸족하지 않는 원리이다. 자신은 받아본 적이 없는, 본성에 의존한 사랑이더라도 그 격세에는 사랑을 그 안에 담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1세의 본성에 의존한 사랑이 ‘받은 사랑’으로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나의 경우, 내 비록 어릴 때 모친을 여의어서 모성애에 대한 경험이 그 시점으로 정지하여버렸으나 그 품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는 있다(사실 관념에 가까운 것이다). 사랑은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연상과 응용에 따른 것이지, 담은 기억이 없다. 기억의 질량이 너무도 적은 까닭이다. 그 적은 기억 이상의 분량은 나의 각색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그마저도 없었다면 사랑은 참으로 요원하였을 법하다.
![]()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대개 우리는 우리에게 내재된 본성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용되는 사랑인 줄 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관습적 사랑과는 별개로 완전히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자기 안에 ‘담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신약성서에서 ‘사랑’의 (정적인) 이미지가 의외로 제한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이 전통적으로 파테르(πατήρ), 곧 아버지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아가페(ἀγάπη)가 ―에로스(ἔρως)처럼 성적이지는 않지만― 여성명사로서 당대에 다소 세속적 쓰임새가 컸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차원적인 사랑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성(聖)스런 이미지로 적극 계몽된 것은 요한복음에 와서야 이루어진 일이며 그것도 명사가 아닌 동사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여성성인 아가페는 자연스럽게 성령이라는 (중성 이미지의) 새로운 주체의 속성 및 주된 활동으로 이양되는데, 어머니 곧 메테르(μήτηρ)의 완곡한 메타포일 것이다. 그러나 아가페로부터 메테르의 성(性)을 제거하지 않은채 방기하다 그 유전적 성(gender)이 신격화 되어 숭배의 대상에 이른 전례가 가톨릭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단은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쓰기도 한다. 모든게 다 사랑의 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독 파테르(πατή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은 가부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요는 무엇이냐.
이 메테르, 즉 성령의 사랑과 어루만짐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다. 뭔가 흉내는 내는데 그 안에 마치 심장 덩어리 같은 아가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받을 줄을 모른다. 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성서는 악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행위는 회개인 것이다.
이를 ‘성령으로 난(γεννάω) 자’라고 성서는 그 (받아본 적 없는 자의) 신분을 개정하고 있다. 다 남성형의 표현이다. 비로소 아버지 곧 파테르와의 화해를 이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