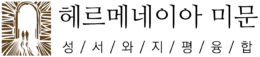지난주에 작성한 노아(2014) 리뷰의 후속편이다. 이 글을 추가로 남기려는 것은 이 영화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지닌 <은혜>의 편벽된 이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확신에서다. 즉 그 나머지 반쪽 이해가 어떤 것인지 남기기 위함이다.
영화 노아(2014)는 이스라엘의 단군 할아버지 격인 ‘아브라함’이 안고 있던 역사적 쟁점을 알지 못하면 그 본질을 소화하기 어려운 플롯으로 구성되었다.
아담과 노아는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 갖다 붙여놔도 조상이 될 수 있는 시조(始祖)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궁극적 시조다. 그가 그러한 지위를 얻기까지 여러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의 분수령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번제(태우는 제사) 드리려는 장면에서 일 것이다.
성서는 100세가 되어서야 그에게 아들을 내려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했다고 기록한다. 아울러 그것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해보고자 한 사건이었다고 기록한다.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물론 이천여년간 교회가 요구해온 신앙적 자세의 모범이다.
하나님의 시험에 달게 응하는 그러한 희생의 자세는 17세기 이후 회의주의가 강타한 이후에도 교회 중심으로 존속되어 왔고 그것은 오늘날 현대에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병약해 다 죽게 생긴 아들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친다며 그들을 내놓는가 하면, 성경책 찢고 말썽 피우던 아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친다며 교회에다 맡겨놓고 가버렸다. 작금에 교회는 그때 그들이 맡겨 놓고 간 아들들로 인해 몸살을 앓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젠 더 이상 그런 아들들을 맡아주고 싶어도 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고 만 것일까.
그러나 한편 다행히 18-19세기 회의주의자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메마른 쓰레기만 쌓인 것은 아니었다. 교회에 쌓인 이러한 골칫덩이 번제물들을 일소하고도 남을 이해의 꽃들이 피기도 했다.
한 예로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전통적인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재구성하였다.
“…어리석은 녀석, 내가 네 아비라고 생각하느냐? 난 우상숭배자다. 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건 내 욕망일 뿐이다.”
그러자 이삭이 공포에 떨면서 외쳤다.
“오 하늘의 하나님, 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만약 나에게 이 땅의 아비가 없게 된다면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리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에 계신 주, 이 애가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이 애가 나를 괴물로 믿는 것이 이 아이에게 더 좋사오니, 나는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그가 Fear and Trembling(1843)이라는 짧은 논문으로 발표한 이 이야기는 이른바 실존 속의 대화 즉, 정경의 행간에 함몰되어버린 부자간의 나머지 대화를 상상력으로 복원해낸 것이다. 마치 태고적 노아를 광기의 노아(2014)로 복원해낸 것 처럼.
이러한 상상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상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여전히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주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악습만큼은 확실히 제거시키는 탁효를 발휘했다.
이교도식 우상숭배는 당시 고대의 풍속으로서 특히 인신제사가 만연해 있었다. 아무 때나 사람을 태워 죽인 건 아니다. 주로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한 부족이나 집단 리더들에 의해 뭔가 결속을 다질 때에 이런 일이 성행했다. 예컨대, 싸움에 나가는 자가 자기 몸을 자해하여 공포를 유발하듯, 적진과 대치한 집단의 족장이 자식을 제물로 의식 삼는 것처럼 효과적인 일은 없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그 얘기가 나온다. 또 성 건축을 하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삼기도 했다. 그것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이런 인신제사를 법으로 금하셨다. 도무지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몰렉(우상)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다(레 18:21; 20:2-5; 사 57:9).
만약 이삭을 드리는 인신제사가 정당한 것이라면 오늘날도 성행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좀 전에 ‘성서에 그런 게 어디 쓰였느냐’고 묻던 이들이 답해야 할 것이다.
인신제사가 제거되고 보다 나은 제사가 제시되었다면 그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절로 된 것이 아니라 부자지간의 그 심금 울리는 대화 – 특히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아들에게 소개하려는 아버지의 고충 – 속에서 얻어진 값진 믿음의 산물임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도 일어날지 모를 것만 같은 이 두려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하나님과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 두 개의 얼굴로 나눌 수 있다.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이해에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이해로의 이행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른다.
이 영화의 노아는 확실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노아는 아니다. 그러나 키에르 케고르의 상상 속의 아브라함 같은 노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실존에서 등장하는 우리 자신은 반드시 그런 모습일 것만 같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 라디오처럼 들을 수 없다. 주로 그것을 라디오처럼 듣노라고 흉내 내는 자들이 들을 수 없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믿음을 강요한다.
아들을 정말 태워 죽이려는 시도를 믿음이라고 했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목소리를 듣고 개혁해내는 것도 믿음이다. 전자가 아닌 바로 이 후자의 지점에서 우리는 루터, 바울, 심지어는 예수 우리 주님을 만난다, 이들은 전자가 아닌 이 후자의 하나님 얼굴과 목소리를 강변한다.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어려운 믿음이고 살리려는 믿음은 쉬운 것 같지만, 이들은 살리는 일 때문에 죽어갔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인신제사 믿음이 아닌, 그 인신제사를 혁신한 아브라함의 과감한 믿음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이름이 후대 모세라는 입법자에게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I WILL BE)는 뜻 야웨로, 그리고 예언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God with Us)는 뜻 임마누엘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거와 관련하여 일종의 통일된 궤적을 이루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달리 쓴다. 죽이라는 분은 그냥 하나님(창 22:1, 3, 9), 살리라는 분은 야웨로(v. 11).
에필로그 | 선물, 은혜
노아(2014)의 핵심 메시지는 ‘선물’이다.
왜냐하면 사실 은혜라는 개념은 추상적이지만 선물은 그 추상적 은혜의 확실한 실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사도 우리 실존 속으로 도래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며느리 셋이 들어갔다”고 했지만
‘한 며느리 몸속 두 태아로’ 들어갔다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이지 성경은 아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두 손녀를 ‘악의 씨앗’으로만 보던 시각이 바뀌어
그것이 악의 씨앗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야웨 이레) ‘선물이로구나’ 라는 이해에 다다를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인식의 궁극에 다다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창 6:8)인 것이다.
추신: 이 글에서 네피림 혹은 셈야자나 뱀껍질에 관해서 더 세밀하게 나눌까 생각했으나 관두기로 하였다. 청바지와 청자켓 입은 노아가 등장하는 이 서.부.영.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