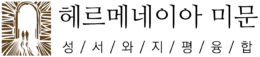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원은 하나 같이 관계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이라는) 어느 한 작은 종족에서 발생한 종교를 믿게 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느닷없이 뚝 떨어진 그 무엇을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원은 어디까지나 관계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났다”(요 1:13)고 하는 계시로서 성질을 부정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계시가 오로지 사람과의 관계를 타고서만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계시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카인은 악인의 시조요 ‘자기 문명’을 창설한 자로서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의 타락과 퇴조는 어디까지나 동생과의 실패한 관계에 기원을 둡니다. 언제나 동생 아벨을 죽인 형으로서 기억되는 것이죠. 카인의 이름에서 따온 땅의 이름 가(카)나안은 정복당해 마땅한 땅의 이름으로 언급되지만, 사실은 이 지명 역시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선행했음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계’란 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명시적인 이름 역시 하나의 민족으로서 명칭(또는 국호로서) 이전에, 한 사람이 체험한 ‘관계’를 역경으로 담고 있으며, 결국 그 관계의 극복이 그 이름이 지닌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열두 아들의 ‘관계’ 속에서 또한 궁극적인 전개를 일으킵니다.
토라(Torah)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이들 두 성산의 이미지는 그런 관계들의 총화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축복을 상징하는 성산 그리심산, 저주를 상징하는 성산 에발산, 이들 두 성산에 열둘을 도열할 때 누구는 그리심산에, 누구는 에발산에 세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따라 붙기 때문입니다. 초 강력한 도그마로 굳힌 이 두 성산의 구도 역시 ‘관계’가 결정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들이 바로 에발산에 도열한 자들인데, 하나 같이 열등합니다. 하나 같이 서자들입니다. 르우벤은 서자가 아니었지만, 아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지은 자입니다. 그러면 혈통이나 도덕성이 기준인가?
스불론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서자도 아니고 르우벤 같은 명시적 타락도 없었으니까요.
이처럼 ‘관계’는 서열을 가르는 강력한 도그마의 원료입니다. 계시가 관계로 말미암아 완성되듯이.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한 마디로 파격적입니다.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안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_사 9:1
과연 당대에 이 예언이 받아들여졌을지 의문이지만,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지는 바로 이 지역으로 확정됨으로써 그의 예언은 성취됩니다(마 4:12-17).
그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에필로그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영남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호남 사람’이라 부릅니까? 아니면 ‘충청도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서울 사람이라고 불리면 나은 편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적용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딛고 있는 땅은 얼마짜리 땅입니까? 비싼 땅인가요, 싼 땅인가요.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우리는 부득이 땅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그 땅의 기질을 이어 받을 수밖에 없지만, 벗어버리기 힘든 그 땅의 도그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빛 비추실 때, 그늘은 빛으로 해체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비출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주현 후 3주차 성서일과 | 사 9:1-8; 마 4:12-23, (cf. 시 27:1, 4-9; 고전 1:10-18.) |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 | 2014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