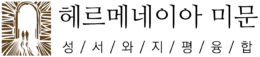“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본문을 설교하려다 보니 내 자신이 교회를 ‘사막화’시킨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하여 나는 한국교회의 사막화에 일조한 일면이 있다.
전통교회를 비판하면서
1-2세대 부흥사들은 천막집회 등지에서 신유와 이적 등 강력한 은사를 통해 먹고 살길 막막했던 민족을 위로하고 일깨워 그들의 영육이 성장할 수 있게 했지만, 말년에 그들은 자기교회를 구축하고 축재하거나 형편없는 자손에게 교회를 부(富)로 물려주었고, 신도들은 자기 일가에 맹종하는 맹목적 신자로 전락시켰다. 이런 논조를 골자로 비판의 날을 세워왔으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신유와 이적을 실행하기엔 역부족인 나 자신의 영성을 변증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신흥 자본교회를 비판하면서
한 대표적 신흥교회의 VIP Room(새신자 영접실)을 방문했을 때 그곳 담임 목회자로부터 이런 노하우를 들었다. “‘우리 교회에 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한다’라는 암묵적 코드를 지역 주민에게 심어준다.” 이후 나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자본교회들이 얼마나 세속화 되었는지를 고발하면서 “그렇다면 노숙자들은 어쩌란 말이냐? 노숙자들은 이 화려한 VIP Room에 들어오지 말라는 코드냐?”라며 힐난하였다.
한 지방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다가 지방의 한 교회에서 근무할 당시 정말로 한 노숙자가 예배드리러 왔다. 나는 그의 곁에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다. 그의 몸에서 역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예배 내내 내 머리 속은 온통 ‘다른 새가족이 시험 들면 어쩌지?’라는 생각으로부터 ‘만약 내가 단독 목회하는 교회라면?’이라는 공상에 빠져 ‘저런 분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지?’라는 상상이 급기야 ‘우리 교회에 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한다-’라는 암묵적 코드로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막화를 저지하기로 작정하면서
나의 경험을 예시로 한국 교회가 사막화 된 일면을 예시할 수는 있었지만, 내가 그 <사막화>를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는지를 설교하기에 막막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금주에 설교를 하지 않을 생각도 하였다. 그런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 몇 가지 사막화를 저지하고 비구름을 불러들일 수 있는 나의 경험을 환기시켰다.
사막화에 대한 저지를 예시하면서
나는 원천적으로 ‘일천번제예물’이라는 비성서적 행위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새벽마다 그것을 실행하는 노인들의 헌금봉투를 받아들고서는 내 이성이 깨진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 체험을 토대로 나는 내가 가진 신학과 지식을 걸고 그 할머니들의 정성어린 신앙을 수호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요약은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천번제도 비성경적이다. 송구영신도 비성경적이다. 송구영신에 말씀 뽑기(?)도 비성경적이다. 그럼 성경적인 건 무엇인가? 유대적인 것? 유대인들이 준수했던 바로 그것? 중세교회적이지 않은 것? 한국적이지 않은 것? 이른바 성경적인 사람들은 뼛속까지 유대인 같은가? 우림과 둠밈은 뽑기 아니고 뭐였던가? 옛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지극히 성경적이며 말씀을 뽑는다는 행위도 신점으로 뽑는 행위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 뽑은 말씀대로 “살며,” “준행 하겠다”는 의지로서 예언적 말씀을 가르치면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수는 신점대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십자가에 달린 자인가 아니면 신점으로 뽑힌 그 모든 갈망 담긴 말씀들을 의지를 사용해 모두 준행한 준행자인가? 이것이 예언의 본질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 그 “성경적인 자”들 지론에 의하면 504번째 비성경적인 예물이 있다. 이 분의 기도제목은 한결같다. 504번째를 지나도록 한결같다. “주님 아시지요” 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 시냐 무할례 시냐 할례 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니라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롬 4:10-11)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읽어도 자꾸 까먹고 있는 이들을 보면 안쓰러울 따름이다. 형식은 질료를 담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막화>를 저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시이다.
사막에서 샘을 보면서
지방 교회의 새벽 기도는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며 그들의 기도란 것이 거의 ‘탄식’ 그 자체일 뿐이다. 눈물샘도 마른 노인들의 탄식은 편견과 도그마를 깨뜨렸다. 그 무엇으로 노인을 구원할 수 있을꼬. 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 중에 매일 새벽에 30분을 걸어오는 수족이 불편한 분이 계셨는데 감사절기의 하루였던 어느 날 헌금함 앞에 서서 어깨에 둘러맨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한참을 낑낑 거렸다.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을 꺼내 드리다가 그 봉투에 쓰인 액수를 보고 말았다.
나보다 적은 액수였다. 그렇지만 새벽마다 5분이면 걸을 거리를 새벽마다 30분 걸려서 걸어오고, 게다가 주일 점심식사는 식판을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주일 남의 신세 지기는 싫고 그래서 그냥 점심식사를 안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수고로움과 불편함을 생각하면, 내 것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고 부끄러워서 그대로 올려놓지를 못하고 거두어들여 헌금을 더 넣을 수밖에 없었다.
사막화 저지에 대한 한계
그리고 끝으로, 생각해보니 나는 성공적으로 노숙자를 돌보지는 못했지만, 수십 년간 새벽과 철야 기도로 예배당을 지켰지만 말년에 우울증을 맞아 고통 받던 한 노인 권사님을 몇 개월 심방한 일이 있다. 그 노인에게서도 냄새는 났다. 나는 그런 일을 잘 못하는데 마음을 바쳐 성심껏 실행했다. (참고로 나는 담임목사가 아니었으며 담임목사가 지시한 일도 아니었다.) 성탄과 송구영신에 즈음하여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목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사실 나는 내가 부교역자로 있는 교회마다 연말이면 유복한 분들이 돌리는 각종 선물들이 있게 마련이었은데 받지 않았다. 아니 안 받을 수는 없으니 받고서는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교회에서 바로 어려운 분들을 나눠 주었다.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보다는 아마도 별로 귀감이 되지도 않는 그들의 선물을 내다 버리고 싶은 못된 마음이 더 컸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난한 이 노부부의 봉투를 받아들고는 실로 마땅함과 말할 수 없는 연민과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중량감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한참을 눈물 짓고 말았다.
결론
<사막화>를 저지할 수 있는 그것은 외국의 신학 이론도 아니요, 어떤 화려한 마케팅 테크닉도 아니요, 가장 말석에 앉은 저분들이 물려주는 신앙 유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환기하게 되면서 금년 성탄 대강절을 희망차게 지나가고 있다.
에필로그 | 사막화에서 옥토화
과학자들은 사하라 같은 광활한 사막이 사막화 된 과정을 발견했다. 그것은 비가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화가 된 것이 아니라 토지의 나무를 제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비구름을 불러올 수 없었다는 학설이다. 나는 이 학설을 믿는다.
심긴 것을 제거하면 사막화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심고 키워내면 다시 비구름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 함께 읽을 글:
성서일과, 사 35:1-10. 마 11:2-11 (cf. 눅 1:47-55; 약 5:7-10. (201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