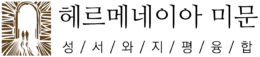프롤로그 | Man at Work (1883)
헤이그에 머무는 동안 고흐는 한 화가로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던 때에, 경이로울 정도의 농촌에 대한 그의 사랑은 당시 그가 동생에게 쓴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테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뭐든 형체가 될 만한 그 뭔가를 그린 풍경을 볼 것 같으면, 난 분명 풍경 화가는 아니야…”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 종류의 요소가 풍경 안에 위치되어 있지만 이내 인간의 형상으로서 직결된 이 인물의 손에다 우리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여기서 이 남자와 자연은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 마치 땅 위에 그들이 함께 심기어진 것처럼. 이러한 강력한 의제는,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불변하는 역사적 실제였던 것이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 그림은 헤이그에서의 동시대 화가들과는 전혀 부조화 된 마무리를 지니고 있었다. 대충 대충 먹여진 그 터치의 상스러움, 그리고 거친 표면의 처리는 깔끔한 마무리를 모든 완성의 기치로 여기던 당대 정서를 몸서리치게 만드는 태도였을 것이다. 그런 자신이 언제나 이질적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그의 말에 잘 나타난다. “그놈들은(다른 화가들 혹은 일반적 사회 정서를 가리킬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언제나 결론 내리곤 하지…!”
이런 고흐 자신의 성급한 기질은 이들에 대한 분노를 한 층 더 격하게 만들었다. 그의 이 같은 성격은 그가 감수해야 했던 예술적 한계만큼이나, 사회 구속에 관한 체제 전복적 이미지로 나타났던 것이다. *Josephine Cutts and James Smith, VAN GOGH (Parragon Book, 2001), 24-5.
본론 |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가지
‘추수감사절’이라는 매년 같은 주제를 어떻게 다르게 설교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앉아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영적인 타락을 느꼈다. 이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여흥을 돋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일반이기 때문이다. 이런 평소답지 않은 유혹을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다음과 같다.
(1)
금주의 성서일과(Lectionary)는 새 하늘과 새 땅을(사 65:17-25) 추수의 감사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성은 “내가 건축한 집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재배한 포도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살지 못하고 자기가 재배한 포도를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
있다. 소작인은 그렇다. 자신이 건축한 집인데도 살 수 없으며, 자기가 재배한 작물인데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마치 제3세계 어린이들은 제1, 2세계 어린이가 가지고 놀 장난감을 만드는 노동에 종사하지만 정작 그것을 가지고 놀 수는 없는 이치이다.
따라서 금주 본문은 감사라는 미명아래 마음껏 여흥에 취해 뛰놀라는 계시가 아니라, 추수를 착취하는 악습을 규탄한다. 특히 이런 악습은 바로 그 뱀이다(25절). 이리와 사자도 변화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만 오로지 뱀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끄트머리에 가서 이리와 사자와 뱀으로 마무리 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뱀은 여전히 흙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뱀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왜 뱀은 흙을 먹는가?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던가? (cf. 창 3:14) 이리와 사자는 초식동물이 되는데 왜 뱀은 여전히 창세기 저주 상태에 있는가?
흙을 먹는 뱀의 습성은 <착취>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사단 곧,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뿔 달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착취>인 것이다.
과학주의나 이성주의로 똑똑한 현대인은 사람이 흙이었다는 사실을, 흙이 피부의 원료가 되는 막연한 화학반응 정도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악을 도깨비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질료와 형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흙이라는 질료는 화학반응을 하는 어떤 입자가 아니라 바로 ‘노동’이다. 이것이 사람의 형상을 구성하는 형식이다.
(2)
교회에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용인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한 고용인일 때에 피고용인과의 분쟁으로 노동부 소환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악의적인 경우 어떻게 고용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지도 잘 알고 있지만, 나 자신이 성경대로 이행했는지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착취가 이루어진다. 사실은 이 본문에서 가장 궁극적 착취의 현장이다.
교회에서 직원이 다쳤는데 단 1퍼센트의 치료비도 지원 않는 목사. (아마도 그는 6-7천의 연봉을 받는다.) 재해 처우에 관한 사회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교회에서 추수감사를 운운한다? 그건 뱀의 근성에 다름 아니다.
이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성전)으로 기뻐하라고 했는데, 성서일과가 묶어 놓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전혀 기쁘신 것 같지가 않다.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으니(21;5-19).
(3)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읽고 있는 Josephine Cutts의 <반 고흐>가 교차되었다. 그 중에서도 Man at Work (1883).
저자는 이 작품을 해석하기를 “자연과 녹아내리고 있는 남자”라고 하였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만 고개를 숙이며 탄성을 자아내고 말았다. 고흐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다.
당대의 풍경화 화풍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싱그러운 풍경들 일색이었는데(오늘날의 추수감사 축제처럼?), 그 중심에 이 소작인과 같은 인물들을 데려다 꽂고 있는 고흐의 폭로. 구체적으로 이 작품의 경우,
아아… 저 소작인의 허리 아래로 다리 굴곡을 보라.
특히 엉덩이로부터 무릎까지의 쌍스러울 정도의 붓 터치.
저것은 그냥 굳어버린 ‘목조기계’인 것이다.
그는 멋진 낭만의 자연과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과업(Work)으로 녹아 땅에 붙박이가 되고 만 도상(圖像)인 것이다.
평생 흙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럼에도 땅이 말을 듣지 않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금년 추수감사절은 이 사실을 폭로한다. (폭로와 계시는 같은 말이다.)
(4)
새 하늘과 새 땅은 제1성전에서 열렸다. 그러나 그 하늘과 땅에 갇히고 말았다. 그러다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제2 성전에서 열렸다. 그러나 다시 그 하늘과 땅에 갇히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헐어버리신다. 그리고는 이 반복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프쉬케(soul)를 얻으라. 너의 인내로.” (눅 21:19)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인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인내가 프쉬케다)
에필로그 | 이리, 사자, BUT 뱀.
이 추수감사가 잔치인지 폭로인지 그 경계 때문에 이사야서 65:25의 “이리, 사자, 뱀,” 세 맹수/맹독류는 두 가지 번역을 낳는다. “이리, 사자 AND 뱀”. 다른 하나는 “이리, 사자, But 뱀”. 후자가 뱀을 제외 시키는 번역이며, NRSV가 그렇게 번역하였다. 나는 NRSV를 지지한다.
* 2013.11.17일자 |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한 가지 | 사 65:17-25. (cf. 사 12 or 시 118; 살후 3:6-13; 눅 21: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