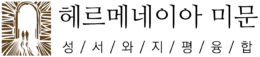‘신과 함께―죄와벌’, 그리고 기독교세계관 = 무당들이나 쓰는 목검(木劒)의 검기(劍氣)가 난무하고, 지옥의 단층별 사신(死神)들이며, 심지어 염라대왕이 심판주로 등장하는 이 영화는 기독교 세계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야말로 무속과 불교가 혼합된 세계관 영화이다.
‘그런 영화를 소재삼을 일이 있나…?’ 눈살을 찌푸리는 분도 계시겠으나, 19세기말 개신교 교리사(史)에 회의적 파문을 일으킨 역사신학의 거장 아돌프 폰 하르낙(Adolf von Harnack)의 말을 시작으로 이 영화에 관해 몇 자 적어보려 한다. 그는 자신의 역작 History of Dogma (1885) 에서 이런 말을 던졌다.
…도그마(교리)는 모든 교회의 배경에서 존재해 왔다. 동방교회는 제의 공간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고, 서방교회는 교권적 측면을, 그리고 개신교회는 복음서의 본질을 추구하는 면에 천착했지만 역설적 사실은 개신교 교회들은 가장 멀리(가장 후대에) 와 있으면서도 그 유리한 위치적 이점을 이용해 도그마들을 일시에 제거하는데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자기 취향에 따라 직설적으로 말하는 방식—우리가 ‘설교’라 부르는 방식—의 도그마로 둔갑해 있다…
History of Dogma 중에서
대부분 이런 종교사학파 아류가 하는 말은 들어보려하지도 않는 경향이 크지만, 이는 교리 파괴적 논지에서가 아니라 오백여 년이나 흐른 지금까지도 ‘개혁’이라는 이름 하나로 지탱해나가고 있는 현대 개신교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가 라는 반성적 측면에서 돌덩이나 나귀와도 같은 이런 작품에서도 한 번쯤 귀담아 들을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神)과 함께’라는 영화가 입고 있는 샤머니즘 만도 못한 ‘죄와 벌’에 대한 희박한 관념이 우리 생명의 교리를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식 정의에 대한 별의별 ‘새 관점’은 아마도 죄와 벌을 우리 삶에서 사실상 제거한데 따른 미봉책이 아니겠는가 반성하면서 우리가 퇴행시킨 ‘죄와 벌’은 무엇인지 이 영화를 통해 잠깐 들여다볼까 한다.

귀인(貴人) Vs. 의인(義人)
주인공 김자홍은 죽어서 ‘귀인’(貴人)이 되었다. 정의롭게 죽은 망자(亡者)를 저승에서 부르는 명칭이라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저승에서도 귀인 만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19년 만에 나온 귀인이라고 하니.
그러나 19년 만에 나온 이 귀인은 죽어서도 스스로를 전혀 귀인이라 생각지 않는다. 그럼에도 저승에서 귀인으로 환대 받는 이유는 그가 죽을 때 의롭게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인이 아닌 의인(義人)이라는 용어를 대입해보면 이 영화는 기독교인이 읽기에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 망자는 죽을 때 고층 건물에서 아이를 안고서 몸을 날려 자신은 죽고 아이를 살렸다. 그리고 죽어서도 자신을 결코 의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 여긴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은 모두 죄인이란 말인가? 평범한 사람은 단지 귀인(의인)이 아닐 뿐이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영화에 따르면, 의인(귀인)이 아닌한 모든 (평범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전제속에서 이 영화의 인간론 및 죄론은 기독교 도그마와 배치하지 않는다.
주인공 김자홍은 저승의 차사(差使) 3인이 에스코트 하는 48번째 귀인이다. 49번째 귀인을 채우고나면 귀인은 물론 차사들 자신도 자기들이 원하는 삶으로 회귀할 수 있다. 단, 망자의 영혼과 지상의 시신이 완전히 분리하는 시한인 49재(齋) 동안 7개의 재판정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한다.
일곱 죄 Vs. 칠죄종
일곱 번의 재판은 일곱 가지 죄를 묻는 심판정이다.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기독교에도 일곱 가지 죄가 있다. 바로 칠죄종(七罪宗, septem peccata capitalia)이다. 이 칠죄종이라는 죄 개념은 원죄와는 달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에 따라 범하는 죄의 근원으로 명시한 것이다. 죄가 일곱 가지 밖에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일곱 가지로 분류되는 일곱 근원으로 일컫는 중세의 죄 개념이다.
중세교회는 이를 교회가 가르치고 훈육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래하였는데, 오늘날의 개신교에서는 낯선 개념이기도 하다. 왜 낯설까? ‘죄가 일곱 가지 밖에 안 되겠느냐?’ 라는 마음에서 개혁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그 죄들은 한 방에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에서 없앤 것일까? 이유가 어찌되었든 개신교에서 개혁한 일곱 가지 죄 근원은 다음과 같았다.

교만 superbia/ pride
인색 avaritia/ greed
질투 invidia/ envy
분노 ira/ wrath
음욕 luxuria/ lust
탐욕 gula/ gluttony
나태 pigritia seu/ acedia
일곱 재판정
개신교에서 일곱 가지 죄 근원이 약화된 결정적 사유는 자신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자기 믿음에 스스로 권능을 부여한 탓일 것이다. 이 영화에서는 그 일곱 가지 죄에 대한 강력한 심문이 주된 플롯을 이루고 있다. 플롯이란 고대 그리스의 비극론에 따르면, 단순한 극/영화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 개인의 삶에 탑재된 이야기(μύθευμα)를 말한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발발하는가?

대리님, 과장님, 차장님으로 승진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인가? 아니다. 그 승진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배신’의 플롯이야말로 진정한 ‘이야기’이다. 친구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영화보는 것이 이야기인가? 아니다.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친구는 미처 구하지 못하고 나만 살아남아 마치 친구를 ‘살인’한 것만 같은 깊은 자책감의 삶이 진정한 ‘이야기’이다. 가족과 놀이공원 다니고 즐거운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이야기인가? 아니다. 함께 가난하며, 가난에 지쳐 동반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진정한 ‘이야기’ 즉 뮈테우마/ 플롯(μύθευμα)인 것이다.
이러한 뮈테우마를 기반으로 이 주인공은 일곱 번의 재판을 받으며, 기소가 입증될 시에는 즉각 해당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조이다. 각 관문에서 죄 사실이 판명되면 각각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1) 살인죄를 심판하는 독사지옥에서는 업무(소방관) 중 미필적 고의에 의한 치사혐의를, 2) 나태 죄를 심판하는 화탕지옥에서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돈을 쫓은 열심이라면 나태 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3) 거짓을 심판하는 거해지옥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 혀를 뽑혀야 하는 판결에 대하여, 그리고 4) 위기에 처한 이를 외면했는가에 대해 다루는 검수지옥과 5) 배신/사기에 대해 심판하는 한빙지옥을 지나, 6) 폭력을 심판하는 도산지옥에서 친동생을 부득이 심하게 때린 죄에 대하여 격렬한 심문을 받은 후에 드디어 마지막 관문, 7) 염라대왕이 버티고 있는 천륜지옥에 다다른다.
기독교인은 이런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죄가 있는 지 없는지, 그리고 그 죄는 실제로 확실히 사하여졌는지, 실제로 사하여졌다면 이젠 다시는 저런 일곱 죄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를 짚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귀인은 어떤 엄청난 의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범인(凡人)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범인(凡人)이 엄청난 악인(惡人)일 수도 있는 이치이다.
우리 기독교인의 내면에 이 일곱 가지 뮈테우마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도 없다면 우리는 진정 산채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일 것이다. 아니면 구원파이거나.

천륜지옥 Vs. 최후의 심판
칠죄종의 마지막 죄가 나태(acedia)인 것에 비해 이 영화의 마지막 죄가 천륜(天倫)이라는 사실은 더욱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플롯이다. 천륜은 부모 형제 사이에 벌어지는 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쉬운만큼 아주 어렵다.
특별히 이 최종적인 일곱 번째 죄는 주인공 김자홍에게 있어서는 여섯 번째 죄와 연결되어 있다. 여섯 번째 죄는 형제와의 사이에 벌어진 죄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일곱 번째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앞의 모든 여섯 가지 죄종(罪宗)과 연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와의 천륜은 인간과 인간의 첫 번째 관계이며 나머지 모든 관계는 파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관계의 근원이 죄의 근원이라고나 할까.
주인공 김자홍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가족과 15년 간을 떨어져서 지냈다. 이에 관해 기소를 한 차사는 놀란 눈으로 이렇게 말한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때린 것에 대해) 화해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 내면 속,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귀인으로 여기는 그 목소리는 이렇게 답한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칭의…’
하지만, 저 차사가 놀라면서 한 질문은 아마도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 5:26; 눅 12:59)는 말씀과 일반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안녕한가?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로 재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삶의 시간을 다 잃어버린 주인공들은 삶을 만회하려 무척 애를 쓴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살아서 해야 할 일을 죽어서 하려고 한단 말이냐.”
우리의 뮈테우마는 안녕한가?
우리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염라대왕과 유비하면 심각한 모독으로 여기지만, ‘죄와 벌’에 관하여 이 영화에서와 같이 상쇄(相殺)가 가능한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 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염라대왕 정도로 여기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우리의 이야기는 안녕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여러분이 영화 플롯을 통해 직접 경험할 기회를 빼앗지 않기 위해. 이것 하나 만큼은 알아두면 좋다. 아버지와 하나님은, 그 대하는 태도를 통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육친의 아버지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가기는 어려운 듯 하다…)